상록수의 서식지와 종류
소나무는 계절에 관계없이 잎의 색이 항상 푸른 상록수입니다.
천 년을 사는 학도 소나무의 가지 위에서 쉽니다.
소나무는 길한 식물입니다.
소나무가 길하다고 알려진 이유는 모든 생물들이 생을 다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겨울에도 소나무의 잎은 시들지 않고
푸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력으로 사람들은 소나무를 불로장수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겨울에 스스로 잎을 떨어트려 수분 증발을 막는 <낙엽수>는 월동에 적응한 새로운 시스템의 나무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는 상록수는 오래된 식물입니다.
상록수인 비쭈기 나무는 한자로는 나무 목에 귀신 신자를 조합해서 <신나무 신>이라고 쓰고, 일본에서는 소나무를 신성한 식물로 여겨서 신사에 바칠 때 사용합니다.
비쭈기나무는 제주도와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일부에 산지에서 자라며 일본과 중국, 대만에도 분포합니다.
제주도와 진도, 완도의 700미터 이하의 산지에서 자라는 붓순나무도 상록수입니다.
서양에서도 크리스마스에 서양 호랑 가시를 이용해서 장식을 하고 유럽 전나무는 신성한 나무라고 생각해서
크리스마스트리로 꾸밉니다.
이 또한 상록수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는 상록수를 길다고 여기면서 아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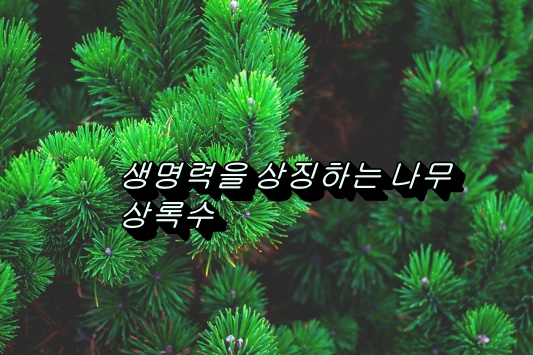
겨울철 낙엽 상록수와 활엽 상록수가 적응하는 방법
그러나 아무리 오래된 식물이라고 할지라도 상록수 역시 겨울철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상록수는 크게 2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겉씨식물인 상록수입니다.
겉씨식물은 추위에 적응하면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잎을 가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식물을 <침엽수>라고 합니다.
소나무는 침엽수과 입니다.
삼나무와 노송나무, 전나무 등의 겉씨식물 중에는 침엽수라고 불리는 식물이 많습니다.
속씨식물이 진화 과정에서 등장하면서 겉씨식물은 겨울철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잎을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나무처럼 잎이 가늘면 햇볕을 쐬고 광합성을 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진화한 속씨식물은 넓은 잎이 특징이며 그래서 <활엽수>라고 불립니다.
스스로 잎을 떼어 버리는 새로운 유형의 활엽수는 <낙엽 활엽수>라고 부릅니다.
활엽수 중에서도 겨울에 잎을 떼어 버리지 않는 <상록활엽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있는 지역의 상록활엽수는 잎의 표면을 왁스층으로 덮어 버려서 수분 증발을 막아 적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잎은 왁스층 때문에 표면에 광택이 있어서 <조엽수>라고 불려집니다.
그렇지만 조엽 수도 한계는 있기 마련입니다.
따뜻한 지역에 분포해서 너무 추운 지역에서는 서식할 수 없습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역시 스스로 잎을 떼어 버리는 낙엽활엽수가 생존에 더 유리하게 적응해 왔습니다.
침엽 상록수는 낙엽 상록수보다 더 추운 지역에 적응하여 분포하며 삽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 홋카이도에는 가문비나무와 분비나무 등의 침엽수가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이나 북아메리카 대륙의 고위도 지역에는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가 숲을 이루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침엽수가 낙엽수 보다 더 추운 지역에서 추위를 견딜 수 있는지 속씨식물이 분포 지역을 넓히는 와중에 왜 침엽수는
낙엽수를 대신할 수 없었는지 실은 침엽수가 시대에 뒤처진 아주 오래된 유형의 식물이었던 점은 뜻밖의 행운
이었습니다.
침엽수의 장단점
더 진화한 속씨식물의 줄기 속에는 물관이라는 수도관처럼 물이 흐를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원통형이고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물관은 뿌리로 빨아올린 물을 대량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엽수는 겉씨식물이라서 물관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곳을 통해서 세포에서 세포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관이 발달하기 전 단계인 <헛물관>이라는 시스템입니다.
물을 한 번에 통과시키는 물관과 비교해 보면 헛물관은 물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물관보다 뛰어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관 속에는 물이 이어져 형성된 물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잎 표면을 통해서 증산으로 물이 소실되면 그만큼 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관 속의 물이 동결되면 얼음이 녹을 때 생긴 기포로 물기둥 속이 비어 버리는 <공동> 이 생기고 맙니다.
이렇게 흐름에 끊어진 곳이 생기면 당연히 물을 빨아올릴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헛물관은 여러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양동이로 물을 전달하는 버킷 릴레이처럼 세포에서 세포로 확실히 전달
합니다.
그러므로 얼어붙은 것 같은 곳까지 물을 빨아올릴 수 있습니다.
공룡이 살던 시대에 지구를 재패했던 겉씨식물은 새롭게 등장한 속씨식물에게 설 자리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동결에 유리한 침엽수로써 매우 추운 지역에 퍼져서 살아남았습니다.
소나무는 눈이 쌓여도 푸르른 잎을 유지합니다.
오래된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소나무는 이 유행에 뒤처진 오래된 시스템 덕분에 길한 식물로서 사람들에게 아직 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연의 신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밤나무와 밤의 성분 (1) | 2022.11.07 |
|---|---|
| 지구 온난화와 멸종위기 동물 (0) | 2022.11.07 |
| 골다공증을 예방 하는 나무 수액 (0) | 2022.11.07 |
| 화려한 옥수수 색과 멘델의 유전 법칙 (0) | 2022.11.06 |
| 탄소발자국과 물발자국 (0) | 2022.11.06 |




댓글